자지, 보지는 비속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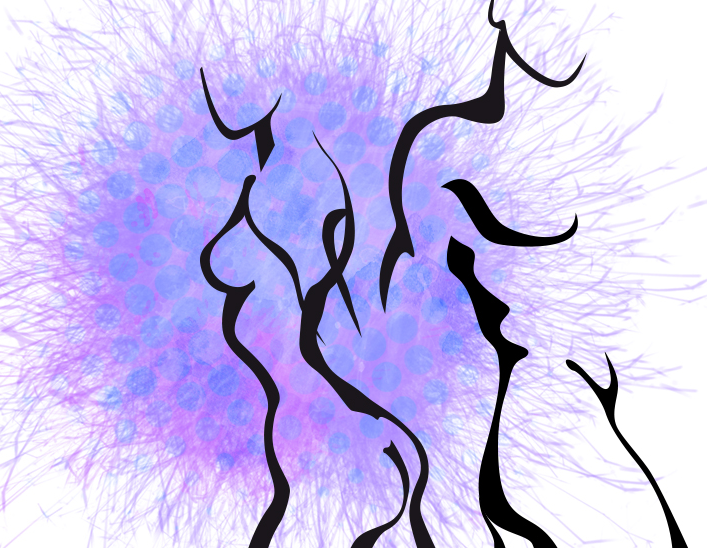
여체(女体)의 부드러운 온기가 떠올라서일까? 샅고랑 사이, 뜨거운 기운 때문일까? 왠지 이 단어를 떠올리면 따스한 기운이 퍼진다. 대칭어가 칙칙하고 메마른 느낌이라면 이 낱말은 따뜻하다. 그러나 이 단어를 함부로 혀 위에 올릴 수 없다.
바로 ‘보지’라는 낱말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제왕절개술(帝王切開術)로 태어나는 아기 외에 모든 신생아가 이 ‘생명의 문’을 통해 세상의 빛을 만나지만, 이 소중한 낱말을 입에 올리면 음란의 덫에 갇힌다.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 받는다.
‘양반의 고향’인 경북 예천군에서는 한동안 주기적으로 웃지만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예천군 지보면의 어르신들은 군수만 바뀌면 면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군청으로 몰려갔던 것. 이 마을의 이름이 언제 정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라 경덕왕 때 지보(知保)에서 지보(智保)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지보면이 됐다고 한다. 아들딸, 손주들이 외지에 공부하러 가면 한결같이 ‘지보’라는 별명을 받으며 놀림을 받으니 참다못해 발길을 뗐던 것이다. 그러나 군청의 공무원이 정색을 하고 “면 이름이 왜 문제냐?”고 물으면, 양반 어르신들은 단어를 설명하지 못해 얼굴만 붉히다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지보’도 그런데 ‘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남조시대의 큰 승려 보지, 고려 공민왕 때의 명신 장보지 등의 이름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다. 심지어 검색 포털에서 보지다르 반도비치(세르비아), 발레리 보지노프(불가리아), 카라 음보지(세네갈), 파피 질로보지(세네갈), 토미슬라프 보지치(크로아티아) 등 축구선수 이름이 ‘19금’에 걸리기도 했다.
보지는 정말 음란한 단어일까? 적어도 국어사전에서는 보지를 ‘음부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규정한다. 음문(陰門), 옥문(玉門). 여근(女根). 하문(下門), 음호(陰戶) 등을 음부의 일상적인 말로 풀이하고 있지만, 글쎄 요즘 누가 이런 말을 쓰는가? 적어도 조선 중기 이후에 식자층은 보지라는 따뜻한 우리말 대신에 이런 요상한 한자어를 쓰면서 일상어를 금기어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궐혈(厥穴, 그 구멍이란 뜻)이라고 쓰기도 했고 그래도 사람들이 ‘보지’를 말하니까, 식자층은 발음은 똑같지만 한자를 입혀 보지(寶池, 보물 연못)라고 쓰기도 했다.
보지와 함께 자지도 ‘금기어’다. 보통사람의 상식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양물(陽物), 남근(男根), 옥경(玉莖). 양경(陽莖). 경물(莖物), 음경(陰莖) 등을 ‘일상어’로 규정하고 자지 역시 비속어로 가둬버렸다. 레몽 크노의 소설 ‘지하철 소녀 자지(Zazie dans le metro)’는 ‘지하철 소녀 쟈지’로 외래어표기를 어겨 출간해야 했다.
그러나 어째서 보지와 자지가 비속어일까? 상식적으로 이 단어들은 보통 말이고 비속서는 씹과 좆이 아닐까? 조개, 조가비나 고추, 연장 등은 유쾌한 비유어(比喩語)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 땅에서 지식인들이 이 소중한 단어들을 입에 올리거나 붓끝에 담는 것은 파격이었다.
동양철학자 도올 김용옥은 한창 혈기가 넘치던 30대에 이 문제를 대놓고 이야기했다. 그는 1986년 지성계를 뒤흔든 명저 《여자란 무엇인가》에서 “자지와 보지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어떠한 표현에도 양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가지며 단순하면서도 풍부한 의미의 면적을 가진다”고 단언했다.
도올은 이 책에서 “왜 자지라는 가치개방적(Value-free)인 좋은 우리말을 쓰면 추저분하고 비학문적이고, 서양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페니스라는 외국말을 쓰면 근사하고 학문적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지·자지는 양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약속의 체계일 뿐이며 음사(淫辭)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책에서 뿐 아니었다 수업시간에 페니스나 섹스, 음부 등의 용어로 도배질한 리포트를 교실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자지, 보지, 씹이야!”라고 열변을 토했다. 칠판에 양을 뜻하는 궤(一)와 음을 뜻하는 궤(一 一)를 쓰고는 “양은 자지야. 음은 쾌쾌한 냄새 나는 것, 그래 보지를 상형한 것이야!”라고 일갈했다.
김삿갓 김립(金笠)으로 유명한 산림처사, 난고 김병연(金炳淵)도 파격적 삶과 어울리는 파격을 필봉에 담았다. 김삿갓은 전국을 떠돌다 생을 마감하는 전남 화순군 적벽으로 가던 도중 자신을 괄시하는 서당의 훈장과 학생들 앞에서 ‘자지는 만지고, 보지는 조지라’라고 고함쳤다. 훈장과 학생들이 얼굴을 붉히며 달려들자, ‘自知는 晩之고, 補知는 早之라’고 설명했다. ‘혼자서 알려고 하면 늦고,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빨리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떤가? 성 영역의 단어들은 조심스럽게 쓰는 것은 세계 각 나라가 엇비슷하다.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성의 진화》에서 언급한 대로 ‘성의 은밀함’은 호모 사피엔스 족의 특징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억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영어권에서는 벌바(Vulva, 보지)와 페니스(Penis, 자지)가 평상시에도, 학술논문에도 함께 쓰인다. Vulva는 “돌다, 꼬다, 회전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Volvere’에서 유래했다. 스웨덴 자동차 볼보(Volvo)와 어원이 같은 말이다. 요즘에는 Cunt, Pussy 등의 단어와 경쟁하고 있지만 볼보처럼 길거리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다. 페니스(Penis)는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중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불문명하지만 어원에는 “꼬리, 자식, 새끼” 등의 뜻이 있었다고 한다. 페니스 역시 비속어가 아니다.
중국어의 자지에 해당하는 낱말은 지빠(鷄巴)다. “홀어미(과부) 꿈속에서 자지 보기”란 뜻의 “과푸밍지엔지빠(寡婦夢見鷄巴)”란 관용구로 “헛꿈 꾸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쓴다. 보지는 비(屄)가 될 것이다. 지사문자로 ‘몸 아래 구멍’을 뜻한다. 이 두 단어 역시 우리처럼 ‘비속한 금기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자지, 보지가 이토록 홀대받는 것일까? 자지 대신 페니스나 음경이라는 말을 쓰면 더 유식해 보여서일까? 음탕한 성문화를 당연시하면서도, 걸리면 매장당하는 이중적 성문화와 관계있는 것일까? 아니면, 체면을 중시했지만 내실은 보잘 것 없었던 양반문화의 소산일까?
보지와 자지로 긴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페니스, 벌바, 음경, 음문이 아니라 보지와 자지로 향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지와 자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중적 성문화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꿈, 나아가서 수많은 영역에서 이성에 뿌리박은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는 우리 사회를 이성적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참고 조선이야기야사
그리고 남은 양이라 마를 조 여성은 음이라 습할습 그런 보지가 건강한 보지라 그말로 와전 된것은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어떤 근거들과 유래들이 있을지 벌써 기대됩니다.
기겁을하니.... 감사합니다!